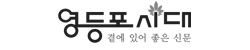|
법정 노인 연령 65세에서 70세로, 검토해야!
나는 그 유명한 ‘58년 개띠’로, 2년 전에 ‘법정 노인’이 되었다. ‘58년 개띠’가 유명한 것은 1953년 끝난 한국전쟁 이후 닥친,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74년) 그중에서도 출생 인구가 100만 명을 넘었던 1959년~1971년 사이의 다산세대(多産世代) 문을 실질적으로 열었던 까닭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와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로 나뉘며, 각각 700만~950만 명 규모로 대한민국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65세 법정 노인 세대로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이 빠르게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1월 17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인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 아시아퍼시픽이니셔티브(Asia Pacific Initiative)가 공동주최해 코트 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열린 <한일협력 2050 : 미래세대의 공통 과제 해결>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한일 양국이 모두 겪고 있는 저출산-초고령화 문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필자가 제시한 의견으로 “저출산-초고령화 화두만 나오면 암담한 미래만 그리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노인들을 생물학적 연령으로만, 보며 무조건 비생산 인구로 몰아내지 말고 그들에게 제2막 인생을 열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생산인구로 노동 현장에 재투입되는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많은 공감을 얻었다. 저출생·고령화로 노동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세대마저 비생산 인구로 전환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 미칠 것이니, 이들의 재고용 및 직업 전환은 국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사실 베이비부머 세대는 대한민국을 세계 최빈국에서 굴지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대단히 우수한 인력으로, 지금도 우리 사회의 주력 구성원으로 왕성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정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여론이 힘을 받는 이유로, 거기서 더 나아가 이른바 생산연령인구 역시 시대에 맞게 현재의 15~64세에서 대폭 상향 조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고령층(55∼79세)의 69.4%가 일하기를 희망하고, 퇴직 평균 은퇴 희망 연령을 73.3세로 원할 정도로 이들의 계속근로 의지는 강하다. 그 이유도 단순히 생활비(55.0%) 마련만이 아니라 ‘일하는 즐거움’, ‘건강 유지’ 등을 꼽은 것이 40%를 넘었다.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위해서도 계속근로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곧장 노인 행복지수로 직결된다. 노인 두 사람 중 1명이 가난하게 살고 있어 OECD 회원국 최고 노인빈곤율 나라 대한민국.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60대 이상 고령층의 행복지수가 6.05점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데, 노동 현장에서의 퇴출에 그 근본 원인인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이른바 100세 시대를 구가하는 이 시대에 조기 은퇴는 긴 여생을 빈곤과 싸우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행복지수를 끌어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초저출산 시대와 초고령화 시대가 한꺼번에 덮치는 이 절체절명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가. 마침, 서울시에서 중장년 세대의 생애 설계나 일자리 교육 등을 지원하는 50플러스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노인들의 노후 행복을 위해 정부에서 직접 나서 6070플러스재단을 만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중규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자문위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