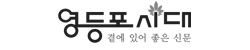|
포용적 자유민주주의 안착에 공헌한 민주화운동
지난 7월 11일 김영삼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김영삼 도서관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함께 했다.
이번 세미나가 독특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기념관 이사장 좌승희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가 나서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1961-1979’를, 김영삼 정부 시절 최장의 오인환 공보처 장관이 ‘국회의원 김영삼의 민주화 투쟁 1954-1973’를 발제하는 등 각각 산업화와 민주화를 완성 시켰던 두 대통령을 연결하려는 시도였다. 살아서는 앙숙 관계로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맞서 반독재투쟁에 가장 앞장섰던 김영삼 대통령 두 위인이 죽어서야 함께 손잡는 감동의 장면이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이 오늘날 선진국이 된 것에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상호 보완하며 서로서로를 과유불급이지 않도록 지켜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본다면, 산업화·민주화 역할은 헤겔의 정(正, thesis)·반(反, antithesis)·합(合, synthesis)의 변증법적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 식민지에서 신흥 국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는데, 그들은 대체로 곧장 장기 집권 독재국가로 나아갔으며 그런 독재정치 속에 부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며 후진국의 늪에 깊이 빠져 헤어날 줄을 몰랐다.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대한민국만 그런 후진국에서 늪에서 빠져나와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 민주화운동이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권력은 제어장치 같은 견제가 없으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 그대로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독재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당시 제3세계에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그럴지라도 4.19혁명이나 민주화운동 등으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더라면 독재의 후유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모를 일인 것이다. 이승만 정권도 박정희 정권도 심지어 전두환 정권도 그에 맞서는 민주화운동이 없었다면 영구집권으로 나아갔을 개연성이 높았던 것이, 이승만 대통령 집권 12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18년, 전두환 대통령 집권 7년에서 모두 그런 조짐이 보였던 것인데 4.19혁명, 부마항쟁, 6월항쟁이 그런 영구집권을 막았다. 김일성 집안이 지배하는 북한처럼 죽을 때까지 하는(김일성 46년, 김정일 17년, 김정은 14년 등) 종신독재로 나아갔을 가능성이 없지 않았으며, 당시 제3세계 여느 종신 독재국가들처럼 대한민국 역시 그런 정치적 후진국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로빈스는 같은 민족과 지리적 조건을 가졌으면서도 남북한이 극명한 경제적 격차를 보인 결정적 이유를 착취적 제도와 포용적 제도 채택 여부에서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운동은 마치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아테네의 타락을 막는 등에 같다”고 했듯이 그 포용적 자유민주주의를 안착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그렇게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은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결과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했다. 그런 측면에서 그날 세미나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세상은 무대, 인간은 한낱 배우”라고 셰익스피어가 말했던가. 박정희와 김영삼, 당사자는 당시 상대를 정적으로까지 여기며 생사를 건 다툼을 오랜 세월 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무대 위에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는 결과물을 낳기 위해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산고의 과정을 혼신으로 연기했던 단짝의 배우였다. 역사의 화해, 기억의 치유가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필요한 이유다. 특히 적대적 진영 정치에 찌든 정치에서 상대 진영을 공존 공생의 동료로 인정하는 민주적 포용적 자세를 지니는 것이 시급하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제1조 1항, 그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모습 아니겠는가.
정중규(대한민국 국가 원로회자문위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